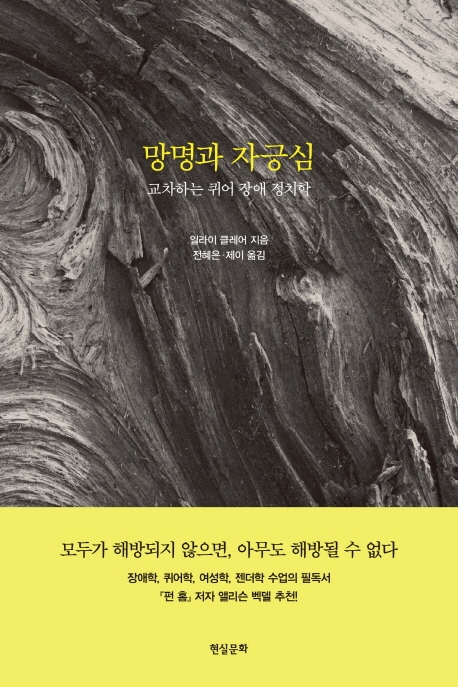
<망명과 자긍심>의 저자 일라이 클레어는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같아 보인다. 저자 소개를 보면 클레어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 젠더퀴어, 친족 성폭력 생존자로 살면서, 장애·환경·퀴어·노동운동가이자 시인,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 가지 소수자성만으로도 삶이 벅찰 텐데 그는 이토록 복합적인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클레어는 시골(정확히는 산골)의 백인 노동계급이기도 하다. 흔히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층이다. 레드넥은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의 골수 지지자이기도 하다. 바로 클레어가 속한 진보 성향의 집단이 가장 경멸하는 계층인 셈이다.
정체성을 떠돌며 삶의 의미를 찾는 ‘혼합계급’
이러한 복잡한 배경 덕분에 그는 어느 유형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독특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노동계급과 중산층 어딘가에 사는 ‘혼합계급’이라고 표현한다. “비록 그 경계 지대가 인정받거나 정의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도” 말이다. 그는 자신이 사이에 걸쳐진 ‘다리’처럼 느껴진다고도 말한다.
이 책의 제목에 ‘망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 때문이다. 클레어는 하나의 정체성에 안주하지 못하고 망명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자긍심을 찾아 헤맨다. 그 덕분에 착취적인 구조에 놓인 소수자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통찰력을 얻었다.
오랜 세월 혐오에 익숙해진 소수자들은 좀처럼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기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불쌍한 존재에 머물러있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복잡성을 성실하게 고민한다.
착취에 맞서는 방식은 복잡하다
이 책의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프릭’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좀 낯선 말이지만 역자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프릭’으로 표기했다. 의미와 맥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프릭의 사전적 의미는 ‘기형, 변종, 진기한 구경거리, 괴물’인데,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긍심의 언어로 의미를 바꿔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
180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중반 사이 미국에서 ‘프릭쇼’라는 게 유행했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프릭’을 보여주는 쇼다. 팔 없는 불가사의, 개구리 남자, 원숭이 인간, 난쟁이, 식인종, 야만인 등이 쇼에 나왔다. 각각의 프릭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개 날조와 거짓이었다. 장애인, 유색인 등이 ‘프릭’으로 쇼에 섰는데 팔려오거나 납치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쇼는 물론 변명의 여지없이 극도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러나 모든 프릭이 불쌍한 전시품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스스로 자신의 연기와 전시를 관리했고 매니저와 함께 일했다. 뻔한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내고 쇼를 구경하는 시골뜨기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여겨졌다. 장애인에게 구걸이나 빈민구호소 외에 다른 삶의 선택지가 없던 시절, 프릭들은 이렇게 장애를 ‘과시’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프릭쇼가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명료한 답을 주기보다는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다. 사회의 착취 구조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그에 맞서는 방식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해하자, 이렇게나 복잡한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이 함께 연대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클레어는 그 어려운 길을 제시한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의 경험에서 시작된 성찰의 결과다.
클레어는 환경운동가지만 산림을 해치는 벌목 노동자들을 손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개벌지에서 장작을 패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벌목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시림을 진심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의해 뿌리까지 흔들릴 마을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클레어는 젠더퀴어로서 도시적인 퀴어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중산층과 상류층 도시민 파티’라고 비판하는 시골 출신 노동계급이기도 하다. 그는 “시골 퀴어, 노동계급 퀴어, 가난한 퀴어들이 우리 공동체의 선두에서 스톤월(성소수자의 역사적 항쟁) 50주년을 축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미국의 사회 이슈가 좀 낯설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책의 질문은 유효하다. 혐오와 낙인은 가깝고 성찰과 연대는 너무 먼, 때로는 심지어 소수자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지금의 한국에서도 말이다.
클레어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자. (중략) 우리 몸을 되찾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한 무모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나누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 착취적 구조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기어코 혐오의 사회를 바꾸고 빼앗긴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
글 권박효원 작가
▼날자꾸나 민언련 2021년 2+3월호 PDF 보기▼
https://issuu.com/068151/docs/_______2102_03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