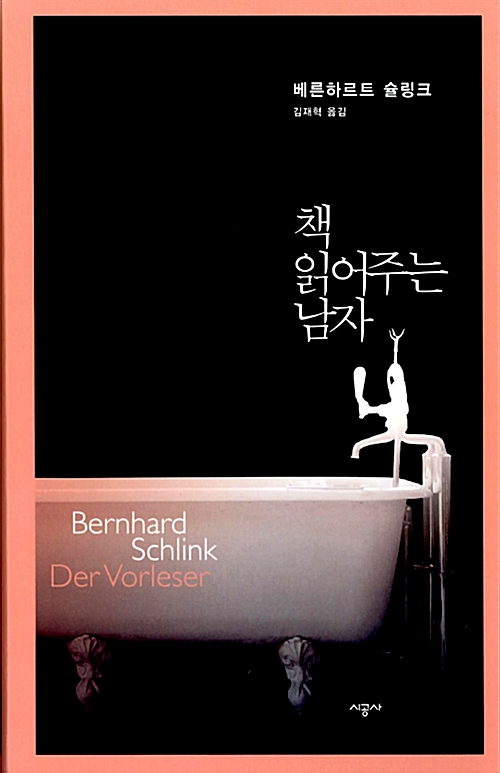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은 얼핏 보면 연애소설 같다. 첫사랑과 성에 눈뜬 소년의 성장 이야기이자 후일담이니까. 실제로 이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 무척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처음 느낀 떨리는 마음, 맹목적인 열정과 욕망, 먼 훗날 다시 찾아온 회한 등등.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다. ‘끔찍한 악행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역사의 가해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책임에서 나는 자유로운가’라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는 강렬한 사랑과 역사적 질문이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를 마냥 남처럼 혹은 괴물처럼 바라볼 수 없는데, 이것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갑자기 떠나버린 첫사랑의 비밀은…
책은 연애 이야기로 시작한다. 1950년대 독일의 어느 소도시, 열다섯 살의 미하엘은 우연히 만난 서른여섯 살의 여자 한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한나는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한다. 그 이후로 책을 읽고 샤워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의식이 된다.
미하엘은 처음 느낀 감정과 욕망에 열병처럼 빠져들지만, 한나의 감정은 훨씬 모호하다. 한나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결코 미하엘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다.
시간이 훌쩍 지나 대학생이 된 미하엘은 법학 세미나 때문에 찾아간 전범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다시 만난다. 한나는 나치 수용소의 감시원이었던 것이다. 첫사랑을 이야기하던 소설은 그렇게 갑자기 역사의 한복판으로 독자들을 끌고 간다.
한나를 비롯한 감시원들은 유대인 여성들을 이송하다가 한 교회에 가두었는데, 교회에 불이 났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람들이 대부분 타 죽었다. 이 재판에서 다른 감시원들은 한나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주범으로 지목한다. 게다가 한나는 회사에서 사무직 승진을 앞두고 퇴직해 스스로 수용소에 취업한 ‘확신범’이기도 했다.
결국 한나는 필적 감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보던 미하엘은 그의 비밀을 알아차린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던 것이다. 한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수치였다. 글을 읽어야 하기에 승진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이 보고서를 썼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말이다.
“당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는 명백한 가해자이며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평생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그 결과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한나 아렌트를 연상시킨다.)
재판 도중 한나는 “수감자들을 죽음 속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을 받고 “재판장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어떻게 달리 행동해야 했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길을 몰랐으며, 뒤늦게 비로소 알고 싶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나의 무지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 내가 누리는 특권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 생명들을 착취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 아니, 알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을까? 한나의 무지가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듯 우리의 무지도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미하엘은 자신이 사랑한 한나를 이해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당대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에게 느낀 애증과 비슷하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도 “범죄자를 사랑한 까닭에 유죄”라고 생각한다. 나치 과거와 대결하려는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느낀다.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그의 죄의식은 우리가 끔찍한 비극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도 비슷해 보인다. 가해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종종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어쩌면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사회적 비극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며, 그 구조를 만들고 지탱한 연대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다.
“범죄자를 사랑한 까닭에 나는 유죄”
사회적 책임 앞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을 한다. 한나와 미하엘 역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제대로 속죄했으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소설은 답을 말하지 않는다. 답을 고민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는 무척 재미있는 소설이지만, 이처럼 질문하고 고민할 것이 참 많다. 가볍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을 곱씹고 질문을 음미하는 느린 독서를 좋아한다면, 이 작품은 며칠을 아껴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나 역할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영화는 책과 일부 내용이 다른데, 두 작품을 비교해 감상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글 권박효원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