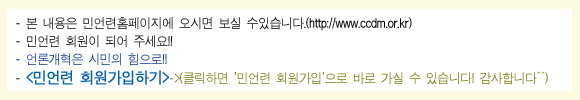논평_
'신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IPI의 공개서한' 및 관련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05.1.14)
'누더기 신문법'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
소위 '국제언론단체'라는 IPI와 국내 일부 신문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오늘(14일) 동아일보는 <세계 언론이 우려하는 '신문 惡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IPI(국제언론인협회)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반색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IPI의 '무지하고도 무례한' 공개서한을 호들갑스럽게 되받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탄압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양 호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발의 한 열린우리당은 물론 이를 합의해 통과시킨 한나라당도 나라 망신을 시킨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이 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IPI의 지적대로 비민주적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비판신문에 대한 통제 의도가 없다면 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악법'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대로 서명해 확정된다면 '참여정부'는 비민주적 언론탄압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등의 억지를 늘어놓았다.
우리는 이런 글을 '사설'이라고 써내는 동아일보가 이른바 우리 사회의 '메이저신문'이라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다.
동아일보는 IPI를 두고 "언론자유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0여 개 나라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유서깊은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IPI가 어떤 단체인지는 동아일보가 더 잘 알것이다.
IPI는 언론사 경영자, 발행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임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IPI의 부회장이자 한국위원회 회장이며 주요 언론사 사장들이 한국위원회 이사라는 점만 봐도 이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모임의 궁극적 목표는 현장 언론인들의 '언론자유' 구현이 아니라 '언론사 경영의 자유', '이윤추구의 자유'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IPI를 '언론사 경영자들의 부부동반 모임'이라고 까지 비아냥거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사에 있어 IPI는 단 한번도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유신시절, IPI가 '한국의 언론상황이 미국, 스위스와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려,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을 정당화해준 일은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IPI는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시민사회단체들의 언론개혁운동을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공개서한'에서도 IPI는 한 국가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두고 무지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동아일보는 IPI의 공개서한이 "언론관계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했으나 우리는 서한의 어떤 부분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IPI의 공개서한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한국 신문들의 사설을 번역해 놓은 수준으로 위헌성을 지적하기는커녕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서한은 신문법 제8조에서 10조에 이르는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Another provision states that readers should be given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editing and production, and that owners of periodicals should hold meetings devoted to the protection of readers interests"라고 썼다.
그러나 IPI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문법은 독자권익 보호와 관련해 '의무조항'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시민언론단체들로부터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관련 조항들은 모두 사업자들이 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거나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IPI는 한국 신문들의 왜곡보도를 그대로 받아 신문법이 독자권익 보호 장치를 의무화한 것처럼 표현했다.
우리는 IPI의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정확한 실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신문 소유주들의 주장만을 대변해주는 행태는 결코 권위있는 국제언론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IPI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싶다면 언론사 소유주들의 '친목모임' 또는 '권익옹호단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태도다.
아울러 우리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에 충고한다. '메이저 언론'이면 메이저 언론답게 처신하라. 허울뿐인 '국제언론단체'를 내세워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관철시키는 낯뜨거운 행태를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가 비민주적 언론탄압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국제친목단체를 동원해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려한 사익추구집단"으로 기록될 것인다.
2005년 1월 1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